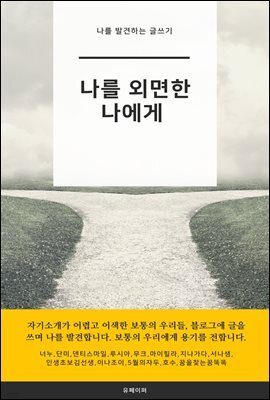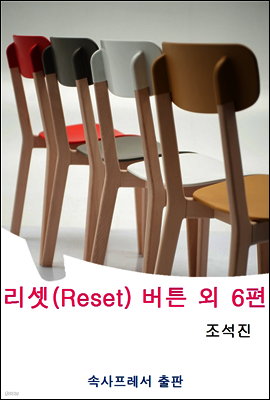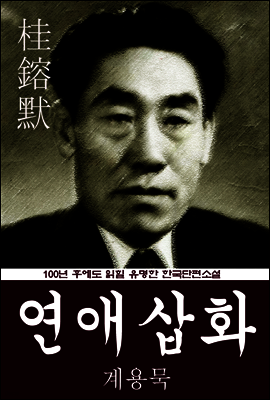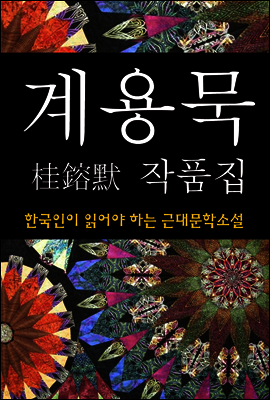
계용묵 작품집 (한국인이 읽어야 하는 근대문학소설 13)
- 저자
- 계용묵 (桂鎔默) 저
- 출판사
- 유페이퍼
- 출판일
- 2016-10-26
- 등록일
- 2017-09-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7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계용묵 작품 모음집이다. 또한 기사를 모아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더했다. 백과사전 등에서 소개하는 것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기사에 있으며 주관적 견해도 재미를 더한다. ----------------------------------- 절망의 수레바퀴 밑에서 계용묵은 핍박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으로 당대 현실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고발했다. 작가의 문제의식은 개인이 지닌 도덕적 가치 자체가 현실에 대해 아무런 힘과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선하디선한 개인은 필사적인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실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갈 뿐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적 폭력이 깔려 있다. 가령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를 다룬 <최 서방>을 보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빚만 남은 딱한 사정이 나온다. 탈곡하고 추수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순간이 미처 갚지 못한 빚에 빚만 더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된다. 오직 “이러한 비인도뎍이요 비룬리뎍인 행동에는 조곰도 눈?보지 안는 그에게는 밥이 생기지 안엇다.”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먼 풍문이 되어버린 지 오래지만 최 서방처럼 우직한 이들만이 이런 현실을 모른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람을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의심을 못 가지는 것이 특색”(<마부>)이며 “하여야 될 일로 눈에 띄이기만 하면 몸을 아끼는 일이”(<백치 아다다>) 없지만 현실은 그들을 버린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걸까? 최서방은 세계가 동정과 눈물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회는 개인의 도덕적 위의와 인격을 평가하지 않는다. 경쟁의 법칙에서 이긴 자만이 인정받고 살아남는다. 애초부터 이런 경쟁은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결과가 뻔하다. 약삭빠른 자들은 윤리적 타락과 사회적 성공이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체질적으로 터득한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시간은 그들의 편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대부분 승리하여 지배계층으로 올라서고 자신의 물리적 힘을 확장한다. 게다가 이데올로기 또한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줄 안다. 가령 송 지주는 최 서방의 곡식을 다 빼앗고, 모자란 부분을 독촉하며 “물지도 못할 걸 쓰기는 그럼 외 그럿케 썻서 응!” 하고 다그친다. 송 지주의 말은 표면상 정당하다. 빌려 썼으니 갚으라는 말은 정당한 거래에 의해 성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의 책임은 고스란히 최 서방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 서방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정한 계약은 이미 선택의 가능 항이 결정된 조건하에서의 자유 계약이다. 물지도 못할 걸 쓸 수밖에 없는 소작인의 처지는 지주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최 서방의 자유는 자신의 체감 범위를 벗어난 범주에 설정된다. 그는 공고한 사회체제에서 자유롭게 노동을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를 상실했다. 지배적 질서는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는 자유만을 보여줄 뿐이다. 현실 표면 뒤에 도사린 질서의 은밀함은 오직 개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해서 가동된다. 근본원인은 사라지고 표면으로 떠오르는 수많은 개인의 갈등은 마치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양 호도된다. 그런 면에서 최 서방에게 쌀을 빌려준 다른 주민들은 최 서방을 때릴 수밖에 없는 가해자이며 피해자로 몰린다. 마을 사람과의 갈등에 아랑곳없이 최 서방의 곡식은 송 지주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만 간다. 계용묵은 개인의 노력과 자질이 변수가 될 수 없는 지점에서 현실의 추악한 진실을 길어낸다. 최 서방 내외가 모든 수확물을 다 빼앗긴 뒤에 “그러나 지주네들은 외 아모러한 뇌력도 업시 평안이 팔장 ?고 ??한 자리에 안젓다가 우리네의 피?을 옴송이채로 들어먹을가”라며 반추하는 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과 정의라는 것이 사실 그리 정당하지도, 객관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은 영역임을 알려준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사회적 존재의 허위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허위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한에서의 그 존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