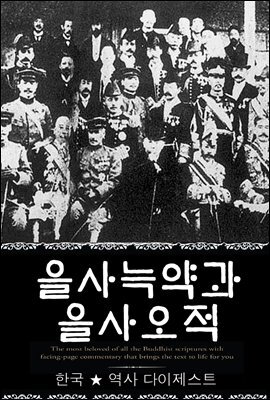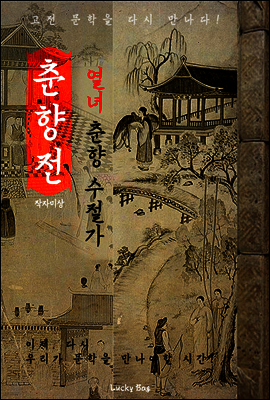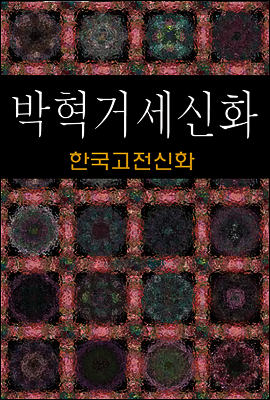흥보가 (興甫歌) - 판소리
- 저자
- 미상 저
- 출판사
- 논객넷 출판사
- 출판일
- 2017-04-17
- 등록일
- 2017-09-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62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판소리 다섯마당 가운데 하나.
‘박타령’이라고도 한다. 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보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보물들이 나와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모진 형 놀보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괴물들이 나와 망한다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엮은 것이다.
사설이 우화적이기 때문에 우스운 대목이 많아 소리 또한 가벼운 재담소리가 많다. 사설의 길이는 짧은 편이며 한 마당 모두 부르는 데 대개 3시간 가량 걸린다. 조선 중기에 이미 불렸으며 송만재(宋萬載)의 ≪관우희 觀優戱≫, 이유원(李裕元)의 ≪관극팔령 觀劇八令≫과 같은 조선 후기 문헌에 처음 보인다.
정조 때의 명창 권삼득(權三得)이 <흥보가>를 잘하였고,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이 그의 더늠이라고 한다. 순조 때의 명창 염계달(廉季達)·문석준(文錫準)도 <흥보가>로 이름을 떨쳤는데 그는 ‘박통 속에서 돈과 쌀을 정신없이 퍼내는 휘모리 대목’을 더늠으로 전하고 있다.
철종 때에는 한송학(韓松鶴)·정창업(丁昌業)이 <흥보가>를 잘하였다 하며, 고종 때에는 최상준(崔相俊)·김창환(金昌煥)이 잘하였다 한다. 김창환은 ‘제비노정기’를 더늠으로 내었던 바, 오늘날 ‘제비노정기’는 그의 더늠을 첫손으로 꼽고 있다.
전승되고 있는 <흥보가> 바디에는 박녹주(朴綠珠)와 박봉술(朴奉述)이 보유하고 있는 송만갑(宋萬甲) 바디, 정광수(丁珖秀)가 보유하고 있는 김창환 바디, 오정숙(吳貞淑)이 보유하고 있는 김연수(金演洙) 바디가 있으며, 박동진(朴東鎭)이 짜 부르고 있는 바디 <흥보가>는 김창환 바디에 가깝다.
그 밖의 <흥보가> 바디는 거의 전승이 끊어진 상태이다. <흥보가>는 바디마다 사설과 소리가 얼마쯤 다르게 짜여 있으나, 흔히 ‘초앞’·‘놀보심술’·‘흥보 쫓겨나는데’·‘매품팔이’·‘매 맞는데’·‘집터 잡는데’·‘제비노정기’·‘흥보 박타령’·‘화초장’·‘제비 후리러 나가는데’·‘놀보 박타령’ 등 뒤풀이로 짜인 바디가 많다.
앞과 뒤에는 재담소리가 많고 가운데에 좋은 소리가 많다. <흥보가>에서 이름난 소리 대목은 ‘중타령’(엇모리-계면조)·‘집터 잡는데’(진양-우조)·‘제비노정기’(중중모리-평조 또는 계면조)·‘박타령’(진양-계면조)·‘비단타령’(중중모리-평조 또는 계면조)·‘화초장’(중중모리-계면조)·‘제비 후리러 나가는데’(중중모리-설렁제)를 들 수 있다.
<흥보가>는 우스운 재담 대목이 많이 들어 있고 끝에 ‘놀보 박타는 대목’에는 잡가(雜歌)가 나오기 때문에 해학적인 마당으로 꼽힌다. 소리도 잘해야 하지만 아니리와 너름새에 능해야 <흥보가>명창으로 제격이라 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