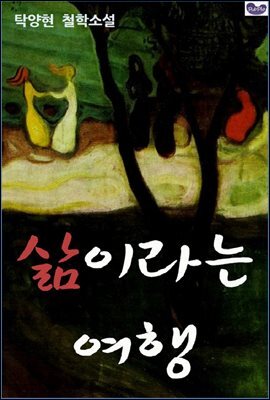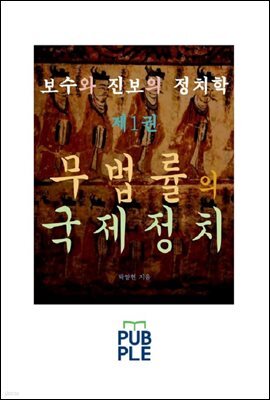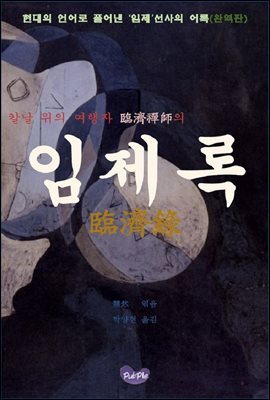
임제선사의 임제록
- 저자
- 임제선사(탁양현 옮김) 저
- 출판사
- e퍼플
- 출판일
- 2018-07-13
- 등록일
- 2018-10-2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칼날 위의 여행자 ‘임제(臨濟)’
‘임제선사(臨濟禪師:?~867)’는 ‘당(唐)’나라의 ‘선승(禪僧)’이다. ‘임제종(臨濟宗)’의 ‘조부(祖父)’로서 ‘황벽희운(黃檗希運:?~850)’의 법맥을 이었으며, ‘사호(師號)’는 ‘혜조(慧照)’이다.
‘논어’가 철저히 ‘공자’의 언행을 기술한 텍스트이지만, ‘공자’가 실제적인 저자는 아니며, 그의 제자들이 기술한 것처럼, ‘임제록’도 철저히 ‘임제’의 언행을 기술하였지만, 실제적인 저자는 그의 제자 ‘삼성혜연(三聖慧然)’이다.
‘임제’의 언행록인 ‘임제록’은, ‘헐!(喝)’에서 시작하여 ‘헐!’에서 끝을 맺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일견 ‘임제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음적(聲音的) 개념은 ‘헐!’이며, 현대적으로는 시대를 풍미한 유행어라고 할 수 있다. 요새 한국사회에서 ‘헐! 대박’이라는 유행어가 회자되는데, 역자(譯者)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기묘한 감회에 젖어들곤 한다.
‘헐!’은, ‘갈(喝)’이라는 한자(漢字)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체로 이 글자를 ‘갈!’ 쯤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주로 꾸짖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갈’이라는 한자어의 발음이 ‘he’이므로, ‘할!’이나 ‘헐!’이라고 번역하여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어 발음은 ‘흐!’ 혹은 ‘흐어!’ 쯤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를 고함지르듯 한다면, ‘할!’이나 ‘헐!’이라고 발음될 것이다. 더구나 ‘임제’는 ‘당’나라 중기에 살았던 승려로서 중국인이다. 때문에 그런 그가, ‘喝’이라는 글자를 ‘갈!’로 발음했을 리는 만무하다.
여하튼 ‘헐!’에는 무한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무한은 곧 텅 빔이다. 그래서 ‘헐!’에는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다. ‘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상황은 동시적으로 종결된다. ‘헐!’의 영역에서는,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인 것이다.
칼날 위의 여행자, ‘임제’는 이렇게 말한다.
“한 사람은, 마음이 영원한 여행 중에 있으면서도, 몸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有一人, 論劫在途中, 不離家舍.]
또 한 사람은, 몸은 집을 떠났지만, 마음이 여행 중에 있지 않다.[有一人, 離家舍, 不在途中.]
어느 쪽이 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가?[那箇合受人天供養?]”
‘임제’에게 여행다운 여행은, 응당 마음의 여행이다. 제아무리 몸이 떠나본들, 마음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그 몸은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아무리 몸을 묶어 놓더라도,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다면, 그 몸을 붙들어둘 방법은 없다.
물론 몸과 마음의 여행이 별개일 수는 없다. 마음이 자유롭게 떠나더라도 몸이 묶여 있다면, 묶여 있는 몸을 떠나도록 하는 데는 적잖은 세월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몸이 떠났더라도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몸도 마음도 모두 얽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제’는 마음의 여행에 비중을 둔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마음의 여행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마음과 몸은 늘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행승(修行僧)들이, 굳이 그러한 몸의 고행을 시도할 까닭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제’는 여행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도’를 추구하는 벗들이여.[道流.]
‘불법’은 억지로 공로를 쌓은 작용이 아니다.[佛法無用功處.]
그저 평상시대로 자연스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다.[祇是平常無事.]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눕는 것이다.[?屎送尿, 著衣喫飯, 困來卽臥.]
어리석은 자들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알 것이다.[愚人笑我, 智乃知焉.]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바깥을 지향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가 어리석고 고집스런 놈들이라고 했던 것이다.[古人云, 向外作工夫, 總是癡頑漢.]
그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의 주인이 된다면, 그대들이 서 있는 ‘지금 여기’ 그대로가 모두 참된 것이 될 것이다.[?且隨處作主, 立處皆眞.]”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일 수 있는, 이러한 여행자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자연스럽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존재가 자기 자신의 바깥을 지향하게 되면, 결코 이러한 여행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물론, 인간존재가 자기 바깥의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가장 기초적인 생존이나 생계를 위해서라도, 바깥의 세상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러한 상태를, 현대의 심리학자 ‘칼 융(Carl Gustav Jung)’은 ‘페르소나(persona)’라고 표현한다.
‘페르소나’는 우리 식으로 이해한다면, 체면치레나 예의범절쯤에 익숙하도록 훈육된 사회적 자아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페르소나’로서, 인간존재들은 사회적이며 집단적인 활동을 시도하고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임제’는 일관되게 그러한 ‘페르소나’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 특히 ‘불도(佛道)’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결코 자기 바깥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바깥을 지향하는 현상은, 지극히 고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공자(孔子)’의 철학사상을 일언이폐지하는 개념인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에서 잘 드러난다.
전통적인 유가철학은, ‘종심소욕불유구’가 하나의 개념인데도, 이를 자기 내면의 욕망을 좇는다는 ‘종심소욕(從心所慾)’과, 사회적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불유구(不踰矩)’로 분리한다.
그리고서는 ‘종심소욕’은 억압적으로 억제해버리고서, ‘불유구’의 측면만을 강제한다. 그래야만 집단권력이 공동체를 계층적으로 소유하고, 그 소유권을 유지하며 지속하는 데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유가철학에 관심을 갖는 자라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숙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수월치 않은 작업일 것이다. ‘공자’ 이후, 일관되게 편면적(片面的)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역사적 관성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고서 새로이 정립해 나아가야 하는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유가철학은 영원히 마치 조선시대의 집단주의적 유학처럼, 늘 시대와 상황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역사적 폐습으로서나 기억될 따름일 것이다.
아주 재미난 역사적 사실로서, ‘공자’ 역시 ‘임제’ 못잖은 여행자였음을 말할 수 있다. 사기(史記)의 ?공자세가(孔子世家)?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이는, 지극히 고대적인 여행자로서 ‘공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자’가 ‘정’나라에 갔을 때, 함께 갔던 제자들을 잃어버리고서, ‘공자’ 홀로 성곽의 동쪽 문 옆에 서 있었다.[孔子適鄭, 與弟子相失, 孔子獨立郭東門.]
‘자공’이 어느 ‘정’나라 사람에게 ‘공자’를 보았느냐고 묻자 그 행인이 대답했다.[鄭人或謂子貢曰.]
‘동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마는 ‘요’임금 같고, 목은 ‘순’임금이나 ‘우’임금 같고, 어깨는 ‘자산’과 같았소.[東門有人, 其類似堯, 其項類皐陶, 其肩類子産.]
그런데 허리 아래로는, ‘우’임금에게 세 치쯤 미치지 못 하고, 그 지친 모습은 마치 주인 없는 ‘상갓집 개’와 같았소.[自然腰以下, 下及禹三寸, 廐廐若喪家之狗.]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문’으로 달려간 ‘자공’은 ‘공자’에게 방금 행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고했다.[子貢以實告孔子.]
이야기를 듣고서 ‘공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孔子欣然笑曰.]
용모에 대한 형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상갓집 개’와 같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말이다.[形狀末也, 而似喪家之狗, 然哉然哉.]”
‘공자’의 삶을 대변하는 표현으로서 ‘주유천하(周遊天下)’는 잘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두루 천하를 여행하면서까지, ‘공자’가 실현코자 했던 이상적인 정치를 이해하고서, ‘공자’를 등용해 주는 군주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 행색이, 결국에는 ‘상갓집 개[喪家之狗]’와 같은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 앞에서 지어내야만 하는 ‘공자’의 웃음은, 지극히 씁쓸한 회한을 담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자’의 ‘주유천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제’의 ‘인물론(人物論)’은 아주 잘 들어맞는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로부터 뛰어난 선배일수록,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오히려 쫓겨나곤 했다.[自古先輩, 到處人不信, 被?出.]
그리고서는 나중에야 비로소 그가 귀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된다.[始知是貴.]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若到處人盡肯, 堪作什?.]”
‘임제’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며 인정받는 자야말로, 정작 쓸모없는 자라고 논변한다. 위에서 기술한 ‘공자’의 상황에 아주 잘 들어맞는, ‘임제’의 담화라고 할 것이다. ‘임제’의 견해에 따른다면, ‘공자’가 쓸모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외려 ‘상갓집 개’의 신세가 되도록 인정받지 못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실세계의 인간존재들은, 훈육된 대로 쉬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응당 좋아하지 않는 자도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다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다보면, 정작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 하게 되어버린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는 ‘페르소나’의 치우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는 결코 여행자일 수 없다.
때문에 ‘임제’는, ‘부처’마저도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선종(禪宗)’의 문화에서는 지극히 기초적인 인식으로서 규정된다. 그런데 ‘부처’마저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부정과 비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다소라도 욕심이 있거나 욕망이 있다면, 이내 집착하게 된다. 그러한 미련을 지닌 상태라면, 결코 부정하거나 비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진보(進步)’는, 기존의 것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애당초 기성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집단권력을 도모하기 위해 결집되는 것이 ‘진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保守)’는, 기존의 것들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득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수’로서 기성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비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수천 년의 역사 안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수’로서 참된 마음으로 공명정대하게 기성의 기득권을 부정하며 비판하는 인물은 아주 희귀하다.
인간존재가 살아내는 동안, 부득이하게 득표를 목적하는 정치인이나, 인기를 목적하는 연예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굳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목적을 지니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코 건강한 지향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임제’는, 온갖 일을 텅 비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논변한다.
“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사람인 법이다.[無事是貴人.]
그러니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오로지 평상시 그대로 자연스레 살아가라.[但莫造作, 祇是平常.]
그대들이 자기 자신의 바깥을 지향하며, 주변을 찾아 헤매면서, 방편을 구해봐야 착각일 따름이다.[?擬向外, 傍家求過, 覓脚手錯了也.]
다만 ‘부처’를 희구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부처’는 그저 명칭이며 글귀에 불과할 뿐이다.[祇擬求佛, 佛是名句.]”
‘임제’는 자기의 바깥에 있는 것은, 그것이 설령 ‘부처’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명칭이나 글귀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이는 참으로 치열한 자기 수행의 과정이다. 곧 칼날 위의 여행인 것이다.
나아가 ‘임제’는, 스스로가 그토록 가혹한 칼날 위의 여행길을 떠돌게 된 까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대들은 그렇게 무언가에 의지하여 이미 변화해버린 ‘불국토’ 안에서,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向依變國土中, 覓什?物?]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과 ‘보살승(菩薩乘)’ 등의 ‘삼승’이나, ‘수다라(修多羅)’와 ‘기야(祇夜)’와 ‘수기(授記)’와 ‘가타(伽陀)’와 ‘우타나(優陀那)’와 ‘니타나(尼陀那)’와 ‘아파타나(阿波陀那)’와 ‘사타가(?陀伽)’와 ‘비불략(毘佛略)’과 ‘아부타달마(阿浮陀達摩)’와 ‘우바제사(優波提舍)’ 등의 ‘십이분교’마저도, 죄다 똥 닦는 휴지일 뿐이다.[乃至三乘, 十二分敎, 皆是拭不淨故紙.]
‘부처’란 허깨비로 나타난 육신이고, ‘조사’란 늙은 ‘비구’일 뿐이며, 그대들에게는 어머니가 낳아 준 진짜의 육신이 있지 않는가.[佛是幻化身, 祖是老比丘, ?還是娘生已否.]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희구하면, ‘부처’라는 ‘악마’에게 붙잡히고, ‘조사’를 희구하면 ‘조사’라는 ‘악마’에게 얽매이고 말 것이다.[?若求佛, 卽被佛魔攝, ?若求祖, 卽被祖魔縛.]
그대들에게 만약 희구하는 것이 있다면, 죄다 고통일 따름이니, 아무런 일도 없느니만 못 할 것이다.[?若有求皆苦, 不如無事.]”
‘임제’는, 대중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삼승’이나 ‘십이분교’마저도, 한갓 똥 닦는 휴지에 불과하다고 선언해버린다. 이렇게 과격한 선언이 가능한 것은, 그의 여행길이 그만큼 절실하였음을 반증한다.
고대의 ‘장자(莊子)’도 이와 유사한 논변을 한다. ‘장자’는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표현해 냄으로써, ‘소요유(逍遙遊)’를 실현한 철학여행자이다.
장자 ?지북유(地北遊)?에는, 이러한 대화가 기술되어 있다.
“‘동곽자’가 ‘장자’에게 물었다.[東郭子問於莊子曰.] “이른바 도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所謂道, 惡乎在?]”
‘장자’가 대답했다.[莊子曰.] “있지 않은 곳이 없다.[無所不在.]”
‘동곽자’가 말했다.[東郭子曰.] “꼭 찍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期而後可.]”
‘장자’가 말했다.[莊子曰.]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다.[在?蟻.]”
‘동곽자’가 말했다.[曰.] “어찌 그리 낮은 곳에 있습니까?[何其下邪?]”
‘장자’가 말했다.[曰.] “돌피나 피 따위에 있다.[在?稗.]”
‘동곽자’가 말했다.[曰.] “어찌 더 아래로 내려가십니까?[何其愈下邪?]”
‘장자’가 말했다.[曰.] “기왓장이나 벽돌 조각에 있다.[在瓦?.]”
‘동곽자’가 말했다.[曰.] “어찌 더욱 심해지십니까?[何其愈甚邪?]”
‘장자’가 말했다.[曰.] “똥이나 오줌 속에 있다.[在屎溺.]”
‘동곽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東郭子不應.]”
‘장자’는, ‘도가(道家)’철학에서 신(God)쯤으로나 여기는 ‘도(道)’가 똥 덩어리 속에나 들어 있다고 선언해버린다. 후대의 ‘임제’ 역시 ‘장자’와 유사한 사유방식을 지닌 탓에, 지극히 유사한 선언을 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야말로 칼날 위에 선 여행자들의 사유방식이 지닌 극단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판단이 없다면, 애당초 그들은 여행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임제’는, 여행자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기도 한다.
“오직 ‘도’를 추구하는 벗들의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唯有道流目前, 現今聽法底人.]
그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삼악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정원을 구경하며 노는 듯하고, ‘아귀’나 ‘축생’에 들어가도 그 업보를 받지 않는다.[入火不燒, 入水不溺, 入三塗地獄, 如遊園觀, 入餓鬼畜生而不受報.]
‘임제’가 판단하기에, 모름지기 여행자는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는 듯이 노닐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에, ‘임제’는 스스로를 칼날 위에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지옥에서라도 노닐 수 있었겠는가.
지옥은 그저 지옥으로서 체험될 따름인 역자로서는, 그러한 경지가 아득할 따름이다. 그러나 ‘임제’의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의 바깥을 지향해서는 결코 무엇도 이룰 수는 없으며, 정작 삶의 끝날이면 감당할 수 없는 회한에 처하고 말 것이다.
‘임제’는, 스스로를 칼날 위에 세움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자기 삶의 여행길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몫일 수밖에 없음을, 몸소 체현(體現)해 주었다.
칼날 위를 여행하는 자는, 아마도 텅 빈 허공의 우주에서 지구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