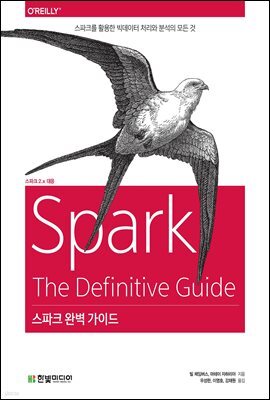신데렐라와 백설 1권
- 저자
- 우성 저
- 출판사
- 사람사는이야기
- 출판일
- 2016-12-21
- 등록일
- 2017-09-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12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나는 신데렐라다. 이름이 신데렐라라는 소리다. 나이는 열아홉.
신데렐라, 라는 이름이 한국 성명 구조상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했다. 그러니 내 주민등록상 이름이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름인 ‘데렐라’만 부르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앞에 성씨인 ‘신’자가 붙는 것만으로 그럴싸하게 이쁘다는 억지스런 변명아래 내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다.
우리 아빠는 서양 동화 속 여자 주인공에 꽂혀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왜, 뭐에 꽂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내 이름의 남다른 독특함을 인식하고, 그게 다른 나라 동화 속 인물의 이름과 똑같다는 걸 안후 아빠에게 물어보면 아빤 늘 이런 식의 답을 할뿐이었다.
“그냥, 이쁘잖아?”
그 이상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아빠는 무능했다. 한 삼십년만 더 일찍 태어나셨더라도 그럭저럭 대충 큰 소리쳐가며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한량’이라는 조금은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이 가능했던 시대니까. 돈은 벌어다 주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는 쳐대고, 맨날 틈만 나면 술 퍼마시고 기집질을 해대도 대강 용서가 되는 시대였다.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라고 들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다. 아빠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났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맨날 술 퍼마시고 기집질을 하지는 않았다. 대충 큰 소리쳐가며 사는 배째라 식의 가장도 아니었다. 그저 무능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누라가 도망을 나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시대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내가 태어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무능했다. 엄마가 도망가고 나서도 꽤나 무능했다. 그러나 남자로서 매력은 있는 모양이었다. 여자를 또 꼬시는 게 가능했던 걸 보면. 그것도 단지 잠깐 놀고 마는 게 아니라 애까지 딸려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온 것을 보면. 난 그렇게 열 살 즈음에 새엄마를 맞이해야 했다.
새엄마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다. 나보다는 한 살이 많은. 좋았다. 처음에는. 언니가 생기는 줄 알았으니까. 아빠 말고도, 새엄마 말고도 나를 보살펴줄 누군가가 생기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내 착각이었다. 언니와 새엄마가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내 삶은 전쟁 같이 변해갔다. 물론 처음에는 알 수 없었다. 그걸 알게 된 건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였다. 남과 ‘비교’라는 걸 하게 되면서부터였다. 팔자가 이름 따라 간다는 걸 점점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건 올해 들어서 더 확실하게 실감해야했다. 나도 몰랐다. 하나 알게 된 건 이거였다.
‘와, 사람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학교의 모든 여자들의 질투가 시작된 날이었다. 그 애가 우리학교로 전학을 온 날은.
백설.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들었다. 그 아이는 우리 반에 배정됐다. 그때부터 난 평소보다 조금 더 한 놀림을 틈이 날 때마다 받아야 했다.
반대로 그 아이는 오자마자 선망이 대상이 됐다. 모든 아이들의. 뭐 별로 부러울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가 잘난 건 잘난 거지만, 내가 ‘신데렐라’라며 구박을 받고 이름 때매 놀림을 받은 것도 하루이틀일이 아니니까.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난 오랜 세월 구박으로 인해 멘탈이 많이 강해진 상태였다. 서로 괜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대로 조용히 졸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동화 속 두 여주인공이 만나는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인어공주까지 나타나주면 정말 볼만하겠다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온달이라고 한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내게 될 교생 선생님의 이름이었다.
“그냥, 니가 싫으니까."
“뭐?"
“니가 싫어서 그러는 거라고."
“그게.. 다야?"
“그럼? 뭐 더 있을 것 같았어?"
어이가 없었다. 요 며칠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이 단순히 같은 반 여자애가 싫다고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
“그냥 니가 싫어,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야, 전학은 니가 왔고, 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보이지 않으면 돼. 조금만 참아,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넌 여자로서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절대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럼 더 이상 이 학교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겠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직은 아니니까 말이야.”
안 좋은 일이 닥칠 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나니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앞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